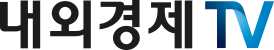[내외경제TV 칼럼] '형용사 없는 신문을 보고 싶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의 형용사 사용 자제'를 촉구하려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려는지 말씀 드리기 위해 전에 쓴 글에서 몇 줄을 좀 줄이고 고쳐서 옮기겠습니다.
"형용사는 기사의 객관성을 해치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 '형용' 혹은 '수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름답다고 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흉하게 보일 수 있다.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보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기사는 독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은 보고를 받은 사람이 한다. 따라서 보고를 하는 사람은 보고서에 자신의 주관은 배제해야 한다. 수식어는 빼고 사실만 담아야 한다. 독자들이 사실만으로 사실을 판단토록 해야 한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사에서 형용사를 없애자'는 주장은 나만 생각했던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한 '진보적' 신문사 사장이자 발행인이 피력한 신문의 형용사에 대한 생각과 의지는 내가 한 설명보다 짧고 단순하지만 훨씬 확고하고 명쾌합니다. 얼마 전 신문쟁이 여럿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대화 주제가 신문 칼럼의 논조(論調)로 넘어갔을 때 나온 대화를 옮겨 봅니다.
"사장님 회사는 칼럼 필자를 어떻게 고르십니까? 사장님 생각이나 신문사의 논조와는 다른 글을 쓰는 분은 피하십니까?"
"나는 비판과 비난만 구별합니다. 비판하는 글은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쓰더라도 관여하지 않지만 비난하는 글은 싣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은 비판이며, 그렇지 않은 글은 비난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같은 사안도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형용사로 구분합니다. 형용사가 없는 칼럼은 비판, 형용사가 있으면 비난.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지막 대답이 압권(壓卷)입니다. 글 속 형용사의 유무만으로 비난과 비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그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나쁜 놈' '더러운 놈' '치사한 놈' …. 가장 저차원적 비난인 '욕' 한마디도 형용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데, '욕'을 '비난'으로, '비난'을 '비판(칼럼)'으로 보이도록 하려면 형용사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이지요.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물이나 행동, 행사, 상품 등을 칭찬하는 것 같지 않게 칭찬하려면 비난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형용사가 동원되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신문에선 형용사가 사라져야 한다는 내 생각은 이 분 덕에 힘을 얻었습니다.
신문의 형용사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형용사는 오히려 종류도 늘어나고 사용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용사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 간격을 점점 더 벌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겨지도록, 별것 아닌 사실을 대단한 사실로 여겨지도록 하려 하니 필요하지 않은 형용사와 부사를 동원하는 어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정당 대변인들이 수시로 쏟아내는 논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자극적인 형용사를 더 많이 알고,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기를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방송가의 예능인들 사이에 '역대급' '레전드' 등 과장되고 허황된 최상급 수식어와 '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 '현생망(이번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포자기적인 언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세태의 영향 탓일 겁니다. 이런 수식어들은 다시 우리 생활로 파고들어 평범한 어휘들로는 대화를 잇지 못하는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과도히 칭찬하는 데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런 대화 말입니다.
과도한 수식어가 동원된 말일수록 되 담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디 욕보다 두 마디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가 더 어렵고, 용서받기 더 힘든 겁니다.
하여, 나는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층일수록,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남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일수록 형용사를 최대한 줄이고, 사실만 주고받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무미건조해질 수도 있겠지만 양극화의 간격이 좁혀질 때까지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입만 열었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혐오와 저주의 반격을 쏟아내는 지금의 세태는 그런 형용사만 사라져도 밝아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