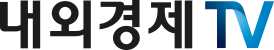[내외경제TV 칼럼] 우연히 눈에 띈 '영문 번역사 모집' 신문광고에 응모한 것을 계기로, 필자는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을 영문만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최한 2002년 축구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돈 받고 일하는 현역에서 물러났을 때, 이미 70대 후반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우리말 글쓰기 공부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자만 저는 학교에서 우리글을 배운 것이 일제강점 하의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조선어'가 전부였습니다.
1938년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이름이 중학교로 바뀌고 '조선어'가 학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짧은 한글 실력으로, 중학 3학년 때에는 하숙집 아저씨 서가에서, 심훈의 '상록수'를 읽어 감명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학에 접한 것은 그것과 이광수의 글 한두 개 뿐, 서정주(徐廷柱)의 시 한 편도 못 읽은 우리 문학의 문외한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읽기를 좋아해 일본어로 된 잡지와 단행본을 남독(濫讀)했습니다. 다섯 살 위의 누님이 보는 잡지를 뜻도 잘 모르면서 같이 읽은 좀 조숙(早熟)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졸업하기까지 줄곧 담임이었던 조선인 선생이 독서광이어서 일본어로 된 소년판 '암굴왕'(알렉상드르 뒤마), '레 미제라블'(빅토르 위고)등 많은 외국 명작들을 독서시간에 읽어 주었습니다.
담임은 아니었으나, 당시 이미 신문 신춘문예 모집에 당선하고 광복 후 소설가로 이름을 날린 김정한(金廷漢) 선생이 우리 학교에 계셔 문학에 눈을 뜨게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김 선생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재직 중 작고한 고향 후배 장정호 군의 장인이어서, 그와 함께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만나, 문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고향 선배인 시나리오 작가 이청기를 통해 많은 문인·예술인들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필가·언론인 조경희 여사와는 남편과도 같이 친분이 있었습니다.
조 여사가 한국수필인협회를 만들었을 때, 편법으로 회원 가입을 해 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한 적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동기생으로 검사를 그만둔 후 변호사로 있던 친구가 이미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망신 당하기 전에 포기한, 지금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기억도 납니다.
외신기자로 일할 때엔 주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딱딱한 기사만 취급하고 문화·예술 관계 글은 쓸 기회가 적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외국인 수녀가 경영하는 고아원 방문기사를 써, 무척 힘들기는 했지만 해외 여러 신문에 실린것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빈 강점처럼 속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글쓰는 공간만을 찾는 한 문학 딜레탕트(dilettante)에 지나지 않던 필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2008년 초 자유칼럼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 행운은 여느 때처럼 인터넷을 섭렵(涉獵)하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두 번 칼럼 시작(試作)을 보낸 뒤, 정식으로 가입 초청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당선한 문학 신인들의 감동이 이럴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칼럼을 주로 방석순, 임철순 두 공동대표가 자상하게 교정과 수정을 해주시고, 다른 필진 여러분도 따뜻하게 이끌어 주셔서, 80대 중반의 초년병 칼럼니스트가 8년 전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말 글쓰기가 제 여생을 확 바꾸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에 감싸여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 자유칼럼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는 저 개인으로서도 무척 감회가 깊었습니다. 배전(倍前)의 정진(精進)을 다짐합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