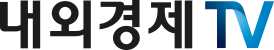사실 사람들은 주필이라는 명칭과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후보로 등장했을 때 주필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나는 그때 약간의 '피해'를 봤습니다. '주필 출신 총리'는 결국 무산됐지만, 친구들이 "야, 너도 충청도고 주필인데 너는 뭐하는 거냐?" 하며 놀리더군요. 근데 그 친구들도 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주필보다 논설실장이나 논설주간이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직위명이 구체적이기 때문이겠지요.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문제의 언론인도 조국일보 이강희 '논설주간'었습니다. 신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필 논설실장 수석논설위원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은 주필 논설주간 수석논설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독자가 "제일 높은 게 누구냐?"고 묻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주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원고 청탁을 해왔을 때 '집필이 아니라 주필입니다'(2011.2.22)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 독자가 "선생님이 신문에 쓰는 칼럼을 잘 읽고 있는데 주필이라는 명칭이 궁금합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낸 데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글을 부분적으로 되살려 소개합니다.
"제가 처음 기자가 됐을 때 주필이라면 정말 하늘같이 높아 보였는데요. 주필은 한자로 主筆, 영어 표기는 여러 가지이지만 저는 chief editorial writer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의 논조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기 쉬울는지. 논설위원실 회의를 주재해 그날 사설로 뭘 쓰고, 누가 쓰고, 어떻게 쓰고를 결정한 뒤 논설위원들이 쓴 사설을 데스킹(글을 고치거나 첨삭하는 일)하고 걸맞은 제목을 붙이는 게 제 임무입니다. (중략) 아울러 한국일보의 경우 논설위원실이 오피니언 면도 제작하고 있어 외부 필진 선정 및 집필 방향에 관한 총괄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중략) 신문사마다 조금씩 달라 주필이 있는 곳, 논설주간이 업무를 총괄하는 곳, 논설위원실장이 우두머리인 곳 등 체제와 운영방식이 각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주필은 오랜 기자 경력을 거친 뒤 편집 관리 직책을 역임하여 관록과 능력은 물론이고 덕망과 지식을 겸비한 인격자라야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신문사에서 편집상의 최고 책임자로, 발행인으로부터 편집업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 받아 해당 신문의 논조와 편집방침을 결정하고 편집내용과 지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신문에서 주필은 다만 논설위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설과 논설기사에 관한 책임만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건에 관한 조선일보 사설(8월 31일자)에도 "주필은 편집인을 겸하기는 하지만 사설란만 책임질 뿐 편집국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에게 일임돼 있다. 주필이 취재 기자에게 직접 기사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송 전 주필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취재 현장이나 각종 모임에서 만나온 언론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대단히 놀랍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도 같은 부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고 민망합니다.
우편물이나 이메일에 논설위원을 논술위원이라고 쓰고, 주필이라고 말하면 집필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터에 송씨는 주필의 존재감을 확실히 아로새긴 셈이 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터진 이 사건이 정권 차원의 기획이든 언론사와 무관한 개인 차원의 일탈이든 뭐든 언론인들은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주필이 뭘 하는 사람인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내부자들'을 봤을 때 '재미있는 픽션이긴 하지만 과장이 심하고 언론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떤 점에서 영화 이상인 것 같습니다. 송씨가 이 영화를 봤는지, 봤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언론인을 어떻게 볼까, 주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술을 좋아해서 주필을 '알코올 펜'(alcohol pen, 酒筆)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런 농담도 이제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긴 대로 살 뿐입니다. 누구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또는 억지로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겠지만 나도 그저 나처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의 정도(正道)를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